
.
치즈 베이컨 버거 한 개랑 체리 코크 하나 포장해주세요~
앞 선 두 명의 주문량이 꽤 많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포장을 한 뒤 언덕에 주저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먹을 계획이었다. 몸이 땀으로 절어있는 터라 매장 내부의 에어컨 바람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다. 주문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처마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네 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걷다 보니 발끝이 살짝 저려왔다. 안쪽의 직원이 급히 나를 따라 나왔다. “여기로 가져다 드릴까요?” 참으로 친절한 곳이었다.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뒤 발가락 테이핑을 다시 했다. 테이핑을 안 했던 발가락 하나에 물집이 생기고 있었다. 테이핑을 마치고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언제부터였는지 오늘 아침의 해와 구름의 싸움에서 해는 패배했고, 그림자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드넓은 청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서해 바닷빛과 하늘의 색이 참 잘 어울렸다.
.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역시 맛집은 맛집이었다. 라이딩을 즐겼는지 한 여름에도 가죽점퍼를 껴입은 한 무리의 아재들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태안 11시부터 호우주의보입니다. 50mm 온대요.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또 비를 맞으며 걸어가야 한다니. 마침 친절한 직원분이 잘 포장된 버거를 가져다주셨다. 원래 계획은 급작스런 비 소식으로 인해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창문을 경계로 누군가는 포장된 버거를 뜯고 누군가는 그릇 위에 올려진 버거를 먹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역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풍경은 걸어가면서 볼 수 있으니 지금은 먹는 것에 집중해야 했다. 와앙. 한입 베어 물자 터져 나오는 육즙과 치즈, 베이컨의 짠기가 입안을 감돌았다. 굉장히 맛있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미친 맛이었다. 도저히 게걸스럽게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손에 쥔 버거를 반쯤 해치웠을 즈음 어디선가 생후 3~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강아지 세 마리가 서로 부대끼며 내 앞을 향해 걸어왔다.
.
한 놈은 하얀색, 한 놈은 까만색, 한 놈은 갈색빛이 도는 세 마리로 보아 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아직 짖는 법도 배우지 않은 듯했다. 버거를 먹는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어디 개껌이라도 있으면 하나 물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다고 버거를 나눠 줬다간 계속해서 버거집 앞을 서성이게 될 것 같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약해진 마음에 손톱으로 얇게 찢은 빵 조각 하나씩을 건네봤지만, 별 감흥이 없는 듯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밖에서 버거를 먹고 있는 행위를 그만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저 아이들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온 이유는 빨리 일어나서 비가 내리기 전에 코스를 마치라는 신의 계시일까. 커다란 외제차 한 대가 먼지를 내며 앞을 지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이들은 맞은편 식당으로 가 사료를 훔쳤다. 역시 배가 고픈 건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
.

.
식사를 마친 탓인지 북쪽을 향한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전 10시 40분. 목적지인 만리포 까지는 8Km가 남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다. 하늘은 아까보다 더 짙은 회색빛을 띄고 있었다. 파도리에서 이어지는 길은 가벼운 언덕을 몇 개 지나는 길이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은돌해수욕장 초입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캠핑장으로 유명한 어은돌 해수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툭 투둑 투두 두두둑. 제법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야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수욕을 즐기던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 뛰었고, 어머니는 주변 정리를, 아이의 아버지는 전쟁이라도 난 듯 엄청난 속도로 텐트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나도 커다란 해송 아래 잠시 비를 피하며 챙겨 온 우비를 꺼내 입었다. 비를 맞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렇지 않게 비를 맞는 나의 모습을 보니 문득, 똑같은 공간이지만 그들과 나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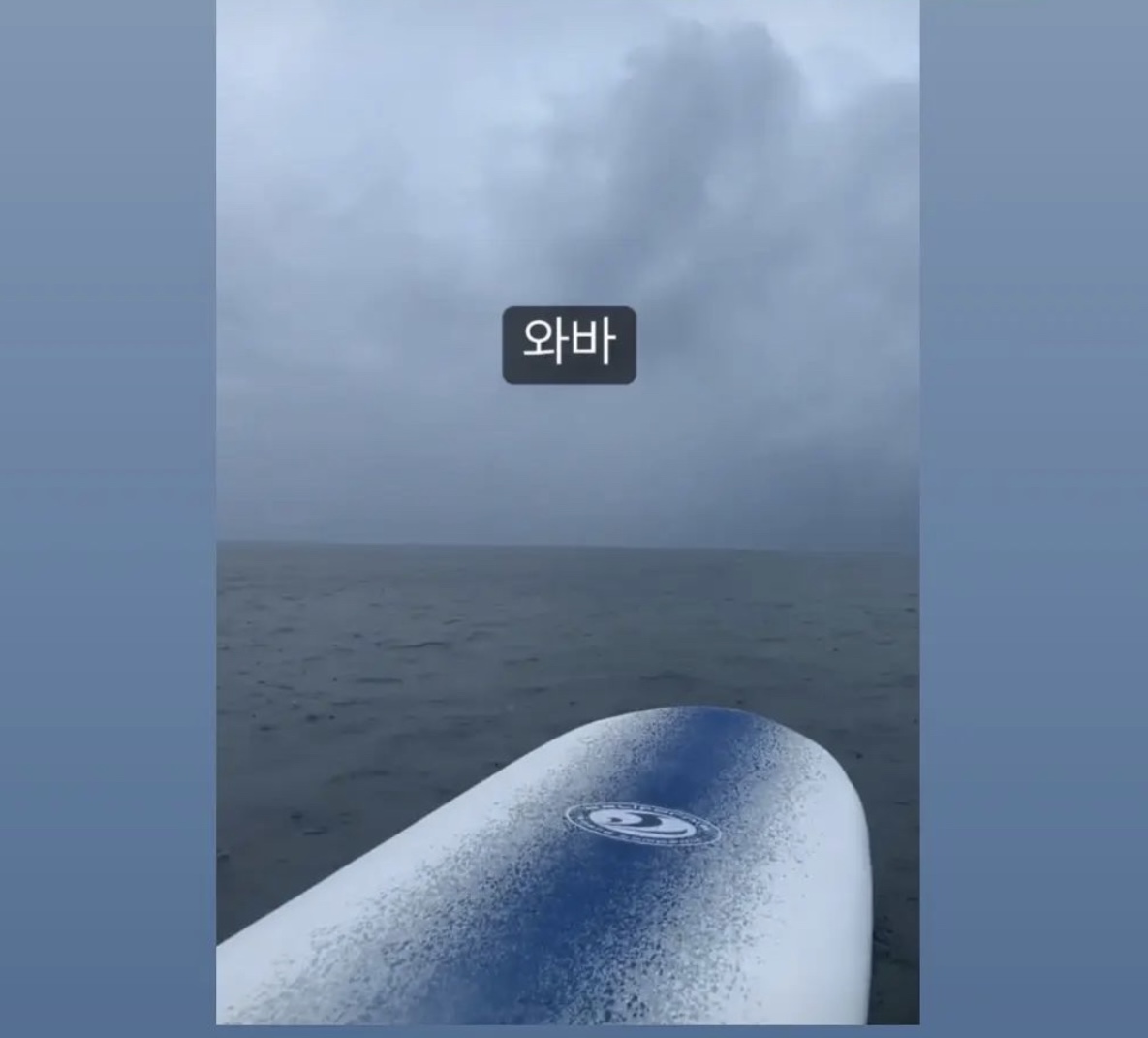
.
어은돌은 모항과 파도리 사이를 이어주는 돌이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이은돌, 여운돌 등으로 불리다가 고기가 숨을 돌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의 지명으로 어은돌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해변을 들여다보니 해변가 치고는 굉장히 많은 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은돌에서 모항으로 넘어가는 길은 육지를 통해야 했는데 잘 포장되어 있어서 걷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때 아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태안 호우주의보인데 어딜 돌아다니는 거유~” 나는 우비를 쓰고 있기에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고 이내 답이 돌아왔다. “그럼 저도 바다 가서 헤엄칠게유~”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잠시 후 SNS 알림이 울렸다. “와바”. 지인이 실시간으로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비를 맞으며 서핑을 하고 있던 것이다. 푸흡. 혼자 걷고 있지 않았다면 민망할 정도로 크게 웃음이 나왔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여기 또 있다니. 마음이 참 훈훈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 보단 둘. 둘 보단 셋. 혼자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즐기는 게 번거로울 순 있어도 더 큰 재미를 가져다준다는 건 확실했다.
.

.
모항저수지를 지나 삼십 분 남짓 산길이 이어졌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탓에 길은 미끄러웠고, 슬슬 신발도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다. 오전 11시 50분. 산길의 끝자락과 이어진 모항항에 도착했다. 항구로 가는 계단에 빗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모항은 띠 모 자를 사용하며 과거 주변 산비탈과 바닷가에 '띠'라고 불리는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이어서 모항으로 불리게 되었다. 모항항은 태안 제일의 우럭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항항에는 모항항 수산시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어획량이 좋다고 한다. 수산시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만 봐도 비가 내리거나 말거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항항은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수산시장을 제외하고는 어딘가 둘러볼만한 곳은 딱히 없었다. 왼쪽으로 온몸이 비에 젖지 않았더라면 들렸을 법한 카페 한 곳만이 언덕 위에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만리포 까지는 불과 3km도 남지 않은 상황.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비에 젖은 신발이 참 무거웠다.
.
.

.
오전 12시 30분. 드디어 목적지인 만리포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태안에 살다 보면 제일 많이 가는 해변이기 때문에 내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왼쪽으로는 만리포 랜드마크 빨간 등대가 보였다. 나는 오른쪽으로 두루누비의 최종 목적지인 만리포 정중앙을 향해 나무 합판으로 잘 조성된 해안길을 걸었다. 신기하게도 너도나도 비를 피하던 어은돌 해수욕장과 달리, 만리포에 들른 사람들은 해수욕을 목적으로 해서인지 내리는 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안전요원들이 안전선 근처까지 다다른 서퍼들을 해안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렸다. 호우주의보가 제대로 들이닥친 듯했다. 엊그제 서울 도심이 빗물에 잠긴 모습을 봐서인지 조금 겁이 났지만, 서로를 도우며 이겨내는 모습도 봤기에 견디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
.

.
흔히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산책하는 것을 추천한다. 산책을 하면 신선한 외부 공기를 마시며 주의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를 알아낸 것 같다. 낯선 이에게 등을 보이던 고양이는 나를 보고 도망갔고, 집을 지키던 개들은 나를 향해 짖었다. 버거집 직원은 내게 친절함을 베풀었고, 지인은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반응했고, 나도 그들에게 반응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걷는 일 즉, 갇혀있던 내면에서 벗어나 바깥세상과 마주하는 행위가 자신의 존재감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말이다.
.
홀로 첫걸음을 옮겼던 시작과 달리, 걷는 동안 주변에는 결코 아무도 없지 않았다. 집을 지키던 개들과 강아지 세 마리, 갈매기, 고양이, 외국인 노동자, 버거집 2명과 직원, 캠핑족, 지인과 함께 걸었다. 사실 그렇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말과 달리 우리는 결코 혼자 살고 있지 않다. 친밀함의 차이나 관심도의 차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과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때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면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버스로 출발했으니, 버스로 돌아갈 차례다. 서해랑길 68번 코스 끝!
.
짧은 글을 마친다. 끝.
'여행 > 국내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버거를 먹기 위해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서해랑길 68번 코스(1) (1) | 2022.08.21 |
|---|---|
| 주말마다 비가 와서 급발진으로 다녀온 트래킹 - 서해랑길 65번 코스 (0) | 2022.08.08 |


댓글